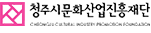수필 작성 프로젝트
| 제목 | 위로의 첫눈. | ||||
|---|---|---|---|---|---|
| 작성자 | 박혜민 | ||||
| 작성자 | 박혜민 | 등록일 | 2020-12-12 | 조회수 | 149 |
| 파일 | |||||
|
중매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 나는 혼기가 차도록 결혼 생각 없었다. 더욱이 남동생이 먼저 결혼해 아이까지 있던 터라 부모님께 나는 아마 큰 짐이었던 모양이다. 정신차려보니 신혼여행지였다는 말처럼 나는 정말 얼떨결에 결혼했다. 친정 부모님은 딸 잘 봐달라고, 혹은 흠이라도 될까 싶어 혼수도 양껏 해주셨다. 그런데 부모님의 염려는 혼수가 아닌 다른게 된건 결혼한지 일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결혼한지 6개월 정도 되자 시댁에서는 아기 얘기 셨고 일년이 되기 전에 난임 병원에 가야했다. 남편도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것 같다. 검사나 해보자며 갔던 난임 병원은 새세상이었다. 차가운 병상, 외로운 처치실. 어둡고 무서웠고 다분히 사무적이었다. 여러가지 검사들은 마음 준비 없이 간 내게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바로 두번의 인공수정. 실패였다. 배에 수없이 많은 바늘을 찌르고 약을 먹으며 매스꺼움을 견딘 댓가가 아무것도 없었고 마음은 피폐해졌다. 삶의 목표가 2세는 결코 아니었는데 마치 아이를 갖지 못하면 내 삶이 실패한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친정 부모님은 죄인 같은 심정으로 모아둔 돈을 진료비에 쏟아부어 주셨다. 병원을 옮겨 인공수정을 한차례 더 했지만 또 실패였다. 모두 착상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인공 수정하면서 한해가 가버렸다. 나는 직장을 결국 그만두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했다.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잡다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악기를 배웠다. 몰입하기 위해 이런저런 돈을 쓰고, 생각을 접기 위해 땀을 흘렸다. 그래도 아기에 대한 생각을 떨칠수가 없었다. 어른들 손에 이끌려 한약도 지어 먹고 주변 사람들의 지나가는 소소한 조언에도 마음이 휘둘려 좋다는 것 뭐든 시도했다. 그렇게 또 시간은 몇년이 흘렀다. 이제는 마지막 시도다 라는 생각으로 큰 병원으로 옮겨 시험관을 시작했다. 다시 여러 검사를 처음부터 했고 배에, 엉덩이에 주사를 놓았다. 마음을 아무리 단단히 먹으려 애써도 혼자 있는 시간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마음이 약해져 이미 실패한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남편에게 미안했고 부모님께 죄스러웠다. 마음이 아팠다. 긴 고통을 이기고 첫번째 시험관에서 아이가 무사히 착상했다. 하지만 심장소리 듣던날 병원에서 돌아와 복통이 시작됫다. 그리고 밤새 하혈 했다. 오징어 몸통 같은 물컹한 덩어리가 뚝뚝 흘러 나왔다. 아픈 배를 움켜쥐고 밤새 울다 응급실 갔는데 유산이었다. 지독하게도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너무 잔인했다. 그로부터 꼬박 2주간 하혈이 멈추지 않았다. 눈꺼풀이 떨리고 손이 저려왔다. 피를 너무 많이 쏟는 탓이었다. 그 누구의 위로도 되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고 잠이 오지 않았다. 아이 태명도 지었는데 미리 지은걸 후회했다. 태명을 부르며 지쳐 잠들곤 했다. 미쳐가는 것 같았다. 혼자 긴 여행을 다녀왔다. 병원에서는 자연 유산이 수술 하는 것 보다 나은거라며 한달만 쉬고 바로 2차를 시작하자고 했다. 다분히 사무적인 의사 말이 되러 위안이 되었다. 두번째 시험관은 착상도 되지 않았다. 3차 시험관은 어른들께 말씀도 드리지 않았다. 또 실패하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고 나만큼 실망하시는 모습 보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3차 시험관 하러 서울 올라가는 날은 11월 말이었다. 아침부터 무척 추웠다. 가는 도중에 차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생겼다. 갓길에 서있는데 지나는 차들이 돌을 튀어 차에 부딪혀 탕탕 소리가 무서웠다. 남편은 긴급 통화하느라 밖에서 동동 거리는데 눈물이 났다. 왜 이 중요한 날 차가 말썽인지, 나는 왜 뭐가 이렇게 다 어려운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모든게 원망스러웠다. 그때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해 첫눈이었다. 펄펄 내리는 눈을 보는데 눈이 내게 말하는것 같았다. 괜찮다고.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다 잘될거라고. 울지 말라고.. 그날 차 문제로 늦어 다소 늦게 진행된 시험관 3차는 성공이었다. 첫눈의 위로. 그리고 선물 같았다. 그 다음해 100년만에 무더위라던 2018년 한여름에 아이를 낳았다. 벌써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지금 내 옆에서 곤히 자는 3살 말썽꾸러기다. 첫눈이라고 하면 학창시절 애틋한 기억이건 즐거웠던 추억이건 떠오를 법도 하지만 내겐 그 고속도로 갓길 위에서 맞은 위로의 첫눈을 잊을 수 없다. 긴긴 터널의 끝을 보여준 선물 같기 때문이다. |
|||||